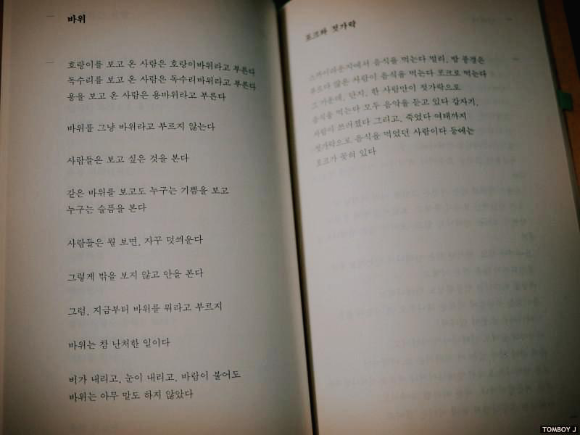
바위
호랑이를 보고 온 사람은 호랑이바위라고 부른다
독수리를 보고 온 사람은 독수리바위라고 부른다
용을 보고 온 사람은 용바위라고 부른다
바위를 그냥 바위라고 부르지 않는다
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
같은 바위를 보고도 누구는 기쁨을 보고
누구는 슬픔을 본다
사람들은 뭘 보면, 자꾸 덧씌운다
그렇게 밖을 보지 않고 안을 본다
그럼, 지금부터 바위를 뭐라고 부르지
바위는 참 난처한 일이다
비가 내리고, 눈이 내리고, 바람이 불어도
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
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.
너무나도 내 마음과 같았다.
말이 말을 만들고,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,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,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였다.
그래서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, 옮길 사람을 생각하며 말을 하고자 하니 나는 더더욱 바위가 되려고 노력한다.
바위는 난처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 더 이상 말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겠지
나의 말이 옮겨다니다 나에게 다시 왔을 때 좋지 않았던 적이 대부분이었다.
내 말에 담긴 나의 뜻, 감정, 의미 등등이 왜곡되어 전해져서 전혀 다른 뜻, 감정, 의미로 돌아온다.
나의 의도가 왜곡된다는 것 그것도 남에 의해서 이러면 참으로 억울하다.
때때로 좋은 의미로 했던 말이 나쁜 결과로 돌아와서 억울한 일이 잦다 보니 더 이상
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의 뜻, 감정, 의미는 최소한으로 담고, 시시콜콜 농담만 던지고 있는 나를 보곤 한다. 씁쓸하다.
이렇듯 호사가들이 주변에 있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다.
어후 피곤해
'밀림의 취미 > 문학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문학리뷰]가지 않은길 (0) | 2021.12.02 |
|---|---|
| [문학리뷰]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(0) | 2020.10.20 |
| [문학리뷰] 지란지교(芝蘭之交)를 꿈꾸며 (0) | 2020.10.16 |
| [문학리뷰] 부기 영화-급소가격 (0) | 2020.10.06 |